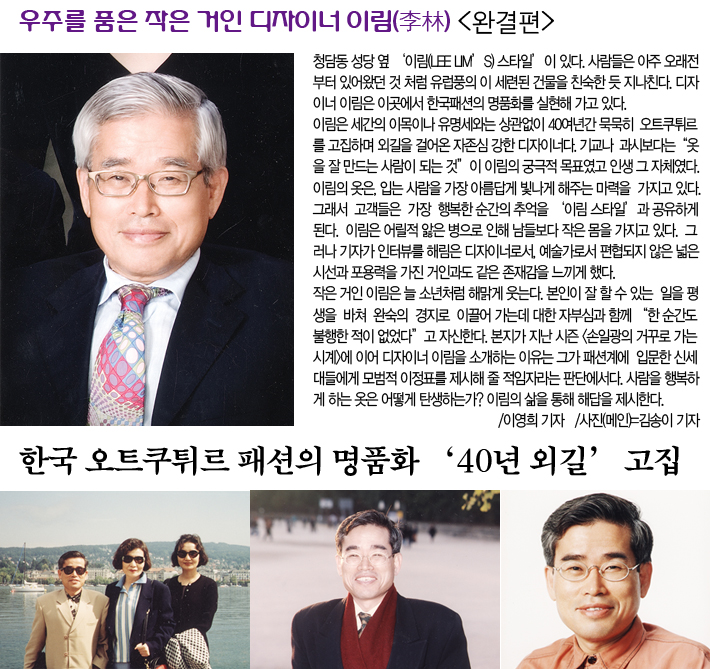
의상은 융합의 종합예술
디자이너로서 인생 후회없어
“봉사와 기여하는 삶” 꿈꿔
이림 디자이너의‘소재사랑’ 폭은 넓다.
이림은 “패션은 창조이면서 협업이다” 라면서 “한 벌의 의상은 소재업체와 디자이너, 패터너와 같은 기술진들의 소산물”이라고 결론지었다.
“과거에는 참 좋은 소재와 기업들이 많았고 디자이너로서도 행복했다”는 이림은 1986년 아시안게임을 기념해 한국잠사회의 후원으로 각국 대사들을 초청해 패션쇼를 했던 기억을 떠 올렸다. 당시 박혜숙 디자이너와 함께 하얏트호텔에서 100% 실크 드레스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때 원도 한도 없이 최고의 실크소재들을 마음껏 써 봤다”며 “소재가 풍요로워 디자이너로서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림은 후배디자이너들에게 항상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 “소재디자이너들이 허투루 놀고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연구해서 소재를 내 놓으면 의상디자이너들은 그 원단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디자인해야 한다. 소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이 너무 심각하고 무겁다”고 지적하고 “입을 대상을 생각해 최적의 편안함과 입어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디자이너 이림의 40년 오트쿠튀르 인생에 대해 취재를 마감할 즈음, 기자는 물었다. “살면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온 인생에 후회는 없는가?”하고.
이림의 대답은 간단했다. “디자이너가 되길 잘했다”는 것과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림은 항상 마음 먹은 것, 생각한 일들에 대해 지체하지 않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늦추지 않았다고 했다.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마꾸지 않았다. 만약 적당한 삶에 안주하고자 했으면 오늘의 디자이너 이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망설임없이 대꾸했다.
이림은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리고 공상도 많이 한다.
파리 뒷골목에서 작은 아트하우스를 만들어 혼자 작업을 하는 자신이 모습을 그려보곤 한다. 그러나 며칠전 칠순을 맞이한 그로서는 못다한 일들을 2세인 진화양이 해 줄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딸 진화는 “공기 좋은 곳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아빠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해 보시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이림은 잠깐 과거를 떠 올렸다.
30여년전 미국 FIT에 3개월 연수를 갔었다. 지하에 박물관이 있었는데 보관한 의상들과 직접 관리하는 학생봉사자들의 노력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 정권때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해 떠 올리며 아쉬움을 내 비쳤다. 그 때에 이림은 파리에 있었는데 많은 숫자의 관련자들이 시장조사차 나왔었다. 엄청난 인원이 들어와 거리낌없이 나랏돈을 쓰는 것을 보면서 적잖이 실망을 했었다.
“우리나라에는 후배들에게 물려줄 자료가 없다. 변변한 관련 박물관조차 없다. 선배디자이너들이 컬렉션만 잘 한다고 책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림은 “머리를 바꾸고 마음을 바꿔 너무 거창한 시작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될 일”이라고 해답을 말해줬다.
“디자이너들이 골프치고 손님과 교제하는동안 막내디자이너들이 원단과 단추를 사러다니는 현실을 하루 빨리 타파해야 한다”면서 “디자이너들은 오로지 의상을 짓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본연의 자세를 지켜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림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트하우스를 관장하는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다는 이림은 서로가 어우러져 살수 있는, 세대를 융합하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터전마련에 남은 인생을 헌신할 각오다.
<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