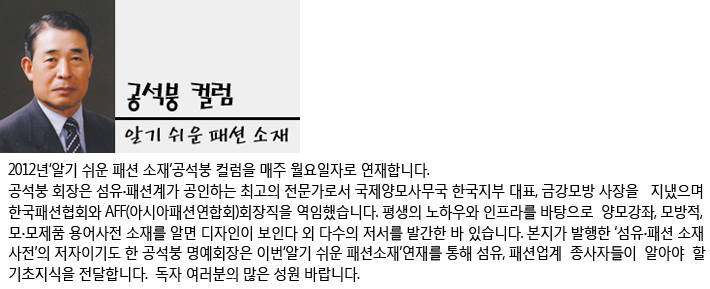
시 스루(see through)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시 스루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 보았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전하다 보니까 좀 싱거워 시스루 소재에 얽힌 이면담을 소개할 까 한다. 시 스루란 글자 그대로 투명해 보이는 소재를 말한다. 시 스루 옷이 크게 유행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

이러한 시 스루·룩의 유래는 시민혁명이 성공하면서 왕후 귀족들의 과잉 치장에 대한 반발, 허식을 배제한다는 고대 로마의 간소한 의복을 규범으로 삼았다는 말도 있으나 가치관의 격변에 따르는 인간성의 부활을 육체미의 과시란 형태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결국 시 스루란 얇은 옷을 말한다. 가령 실내에서 댄스를 하다가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밖으로 나감으로써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당시의 의사들이 많은 경고를 발하였지만 유행은 거스를 수가 없었다.
동시에 이때 숄이 크게 유행 하였는데 이것도 시 스루 옷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19세기 초, 파리에 인플루엔자가 창궐해서 많은 시 스루 족이 여지없이 희생되었다. 이래서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을 얇은 옷 병. 머즐린 병 환자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때 희생된 어느 젊은 여성의 묘비에는 ‘1802년12월 21일 오전 6시 23세의 루이스. 루훼블, 살인행위와 같은 모드(유행)의 희생자 여기 잠들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근세에 들어오면서 이 시 스루소재가 다시 크게 유행 하였던 것은 1988년 가을 프랑스의 오트쿠튀르 쇼에서 이브 생 로랭이 아주 얇은 견직물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모델에게 입혔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것은 물론 그 전년도인 1987년 파리 컬렉션에서 얇은 투명한 옷 여러 벌을 겹쳐 입음으로써 중첩된 옷의 색상이나 모양에 재미를 붙여준 일종의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었다. 유행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언제 또다시 시 스루 패션이 다가올는지 관심거리다.


